[2025 해양탐사 제주바다, 그 변화의 기록] (8)하귀리 마을어장
입력 : 2025. 08. 07(목) 03:00수정 : 2025. 10. 10(금) 08:32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남북으로 바뀐 물길… 소라와 해삼이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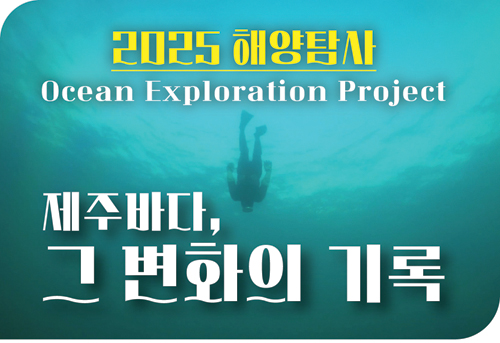
애월항 개발 이후 조류 흐름 변화… 저서성 어패류 급감
모자반 많고 소라·해삼은 실종… 10년 전과 다른 바다
"소라, 작년보다 10분의 1 수준… 해삼도 찾기 힘들어"
전문가 "해류·서식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 연구 시급"
[한라일보] 지난 7월 14일 오전, 본보 해양탐사팀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마을어장을 찾았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하귀리 어장은 잔잔했다. 이곳은 제주에서 참모자반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어촌계 중 하나로, 우뭇가사리와 톳 등 다양한 해조류가 자생하는 비교적 건강한 바다로 알려져 있다.
탐사팀은 하귀1리 동귀포구에서 스쿠버 장비와 수중 촬영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했다. 수심 3~5m의 비교적 얕은 해역이지만, 해조류 착생 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는 깊이였다.
물속은 조용했다. 햇살이 수면을 비집고 들어왔고, 수중 시야도 양호했다. 자연 암반과 블록 구조물 위에는 모자반, 톱니모자반, 큰알쏭이모자반, 큰열매모자반 등 다양한 모자반류가 풍성하게 붙어 있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블록 위에도 큰열매모자반이 두텁게 자라 있었다. 자연 암반 위에는 우뭇가사리로 보이는 홍조류와 그물바탕말로 추정되는 갈조류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7월은 대부분 단년생 해조류가 '끝녹음'을 겪으며 소멸하는 시기다. 일부 미역은 부착기만 남긴 채 생을 마무리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방파제 인근으로 다가서자 전갱이 떼가 유영했고, 테트라포드 사이에서는 거북복, 벵에돔, 저울베도라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류는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012년 5월 조사 당시 흔했던 소라, 성게, 홍해삼 등 저서성 어패류는 좀처럼 관찰되지 않았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이곳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일까?
김운상 하귀1리 어촌계장은 '물길'의 변화를 지목했다.
"제주는 원래 바닷물이 동서로 흐른다. 그런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이후 방파제에 물이 부딪히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은 모래가 다 빠지고, 또 어떤 지역엔 모래가 쌓였다. 소라나 해삼은 모래와 암반이 적당히 섞인 곳에서 잘 자라는데, 지금은 서식 환경이 바뀐 것이다. 작년에는 소라를 3000㎏ 넘게 수확했지만, 올해는 300여㎏밖에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는 해저 환경 변화 사례로 애월항 인근 고내리 어장을 언급했다.
"고내리 마을어장은 모래가 많이 유입되니까 해삼 같은 게 많이 난다. 우리는 재작년에 홍해삼 수만 마리를, 작년엔 전복 5만 마리를 방류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보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조류 흐름의 변화는 체감으로도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곳에 배를 세워 보면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방향도 다르고 세기도 다르다."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년과 재작년엔 여기가 모래펄이었는데, 올해는 돌밭이 됐다. 작년엔 모래가 암반을 덮어서 우뭇가사리가 거의 없었다. 그해 우뭇가사리는 20포대 채취했는데, 올해는 45포대를 저장했다. 톳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났다."
이 같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 한 해양물리학자는 "애월항 방파제가 물길 변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실험과 모델링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연안 해류는 조석 흐름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흐르지만, 대규모 항만 구조물이 설치되면 국지적인 조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실측 조사가 필요하다."
도내 한 해양생태전문가는 "소라 등 저서성 생물이 선호하는 감태 같은 다년생 해조류는 잎에 규조류가 부착돼 주요 먹이원이 된다. 그런데 이 해역은 엽체가 작은 모자반이 대부분이고, 석회조류 비중도 높다. 이는 저서성 패류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제주 바다에서 소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하귀마을어장의 생물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탐사취재팀 : 고대로 편집국장·오소범 기자/ 수중영상촬영 : 오하준 감독>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모자반 많고 소라·해삼은 실종… 10년 전과 다른 바다
"소라, 작년보다 10분의 1 수준… 해삼도 찾기 힘들어"
전문가 "해류·서식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 연구 시급"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하귀리 어장은 잔잔했다. 이곳은 제주에서 참모자반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어촌계 중 하나로, 우뭇가사리와 톳 등 다양한 해조류가 자생하는 비교적 건강한 바다로 알려져 있다.
 |
물속은 조용했다. 햇살이 수면을 비집고 들어왔고, 수중 시야도 양호했다. 자연 암반과 블록 구조물 위에는 모자반, 톱니모자반, 큰알쏭이모자반, 큰열매모자반 등 다양한 모자반류가 풍성하게 붙어 있었다.
특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 블록 위에도 큰열매모자반이 두텁게 자라 있었다. 자연 암반 위에는 우뭇가사리로 보이는 홍조류와 그물바탕말로 추정되는 갈조류가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7월은 대부분 단년생 해조류가 '끝녹음'을 겪으며 소멸하는 시기다. 일부 미역은 부착기만 남긴 채 생을 마무리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
| 항공 촬영으로 바라본 애월항 전경 |
 |
| 콘크리트 블록 위에서 자라고 있는 큰열매모자반 |
 |
| 지난 2012년 5월 동귀어촌계의 우뭇가사리 공동채취 모습 |
방파제 인근으로 다가서자 전갱이 떼가 유영했고, 테트라포드 사이에서는 거북복, 벵에돔, 저울베도라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류는 활기찬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 2012년 5월 조사 당시 흔했던 소라, 성게, 홍해삼 등 저서성 어패류는 좀처럼 관찰되지 않았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이곳 해양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일까?
김운상 하귀1리 어촌계장은 '물길'의 변화를 지목했다.
"제주는 원래 바닷물이 동서로 흐른다. 그런데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이후 방파제에 물이 부딪히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흐른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은 모래가 다 빠지고, 또 어떤 지역엔 모래가 쌓였다. 소라나 해삼은 모래와 암반이 적당히 섞인 곳에서 잘 자라는데, 지금은 서식 환경이 바뀐 것이다. 작년에는 소라를 3000㎏ 넘게 수확했지만, 올해는 300여㎏밖에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
| 전갱이떼 |
 |
| 거북복어 |
 |
| 벵에돔 |
그는 해저 환경 변화 사례로 애월항 인근 고내리 어장을 언급했다.
"고내리 마을어장은 모래가 많이 유입되니까 해삼 같은 게 많이 난다. 우리는 재작년에 홍해삼 수만 마리를, 작년엔 전복 5만 마리를 방류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안보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조류 흐름의 변화는 체감으로도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곳에 배를 세워 보면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 수 있다. 지금은 방향도 다르고 세기도 다르다." 지형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작년과 재작년엔 여기가 모래펄이었는데, 올해는 돌밭이 됐다. 작년엔 모래가 암반을 덮어서 우뭇가사리가 거의 없었다. 그해 우뭇가사리는 20포대 채취했는데, 올해는 45포대를 저장했다. 톳도 작년보다 더 많이 났다."
이 같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 한 해양물리학자는 "애월항 방파제가 물길 변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실험과 모델링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 돌돔 |
 |
| 부착기만 남긴 채 생을 마무리한 미역의 흔적 |
 |
| 수중탐사 모습 |
그는 "제주의 연안 해류는 조석 흐름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서 방향으로 흐르지만, 대규모 항만 구조물이 설치되면 국지적인 조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입증하려면 실측 조사가 필요하다."
도내 한 해양생태전문가는 "소라 등 저서성 생물이 선호하는 감태 같은 다년생 해조류는 잎에 규조류가 부착돼 주요 먹이원이 된다. 그런데 이 해역은 엽체가 작은 모자반이 대부분이고, 석회조류 비중도 높다. 이는 저서성 패류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제주 바다에서 소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하귀마을어장의 생물적 변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탐사취재팀 : 고대로 편집국장·오소범 기자/ 수중영상촬영 : 오하준 감독>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