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48] 3부 오름-(107)머체오름이 돌무더기로 만들어졌다는 황당한 이야기
입력 : 2025. 10. 28(화) 03:00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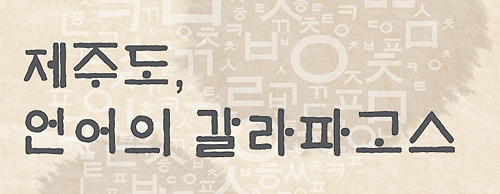
민오름은 나무 없는 오름?
[한라일보] 남원읍 수망리에 민오름이 있다. 표고 446.8m, 자체높이 97m다. 정상을 중심으로 남동 방향과 북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내린 등성마루가 두드러진다. 1703년 탐라순력도에 문악(文岳)으로 표기한 이래 민악(敏岳), 민악산(敏岳山), 민악오름, 민악(敏岳)으로 표기하였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민오름으로 나온다.
민오름이라는 지명에 대해 제주도가 발간한 제주의 오름에는 나무 없는 풀밭인 오름인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민오름이란 지명 설명은 대부분 이와 대동소이하다. 오름 지명 전문 서적이랄 수 있는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했으니 누구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오름만이 아니다. 민오름이란 지명을 가진 오름은 상당히 많다. 제주시 오라동 표고 252m, 봉개동 명도암 마을 표고 643.1m, 구좌읍 송당리 표고 362m, 조천읍 선흘리 표고 519.9m,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표고 503m의 민오름을 비롯해 서귀포시 중문동 표고 882.7m 민ᄆᆞ르라는 오름도 있다. 이 오름들의 지명 설명은 예외 없이 나무가 없어서 즉, 민둥산이란 뜻에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나무가 없는 오름이라 하려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상태가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무가 있다가 산불 같은 재해로 나무가 사라진 것이라면 언젠가 또 나무가 울창해질 수 있다. 제주시 오라동의 민오름 지명은 ‘민악(珉岳)’, ‘문악(文岳)’, ‘미악(米岳)’, ‘쌀오름’, ‘민악(敏岳)’, ‘소독악(小禿岳)’, 족은민오름’, ‘술악(戌岳)’, ‘ᄀᆞㅣ오름’이 검색된다. 이 오름은 원래 믠오름으로 부르던 것이 민오름 또는 믜오름, 미오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한자로 차용한 지명이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등이고, 민둥산이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머체오름, 머체가 뭐?
그러나 이 오름은 인접한 남조순오름 등 다른 오름에 비해 나무가 없다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특징도 증거도 없다. 다만, 등성마루가 평평하다는 특징이 있다. ‘ᄆᆞ르(마루)’ 오름이다. ‘ᄆᆞ르’는 ‘미’로도 축약된다.
그러니 미오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여기에 관형격 ‘ㄴ’이 붙으면 민오름이 된다. 쌀오름은 미악을 한자로 차자 표기한 것을 다시 쌀오름으로 번역한 오독이다. ‘술악(戌岳)’ 역시 쌀을 중세에는 ‘ᄉᆞᆯ’이라 했으므로 이의 다른 표기다. ‘ᄀᆞㅣ오름’은 ‘ᄉᆞᆯ오름’과 음상이 비슷한 한자를 동원하여 ‘술악(戌岳)’으로 썼고, 다시 이 술(戌)이 ‘개 술’이니 여기서 분화한 표기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본 기획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민오름을 ‘골짜기가 없는 오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독한 바 있으나, 이것은 인근의 병악이 골짜기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고 이에 대비 지명으로 골짜기가 없어 민오름이라 한다는 취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민오름은 ‘ᄆᆞ르’오름이라는 뜻이다. 즉, 산등성이가 길게 형성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문도지오름도 같다. 남원읍 수망리의 민오름 역시 ‘ᄆᆞ르’ 오름이란 뜻이다.
이 민오름 서쪽으로 머체오름이 있다. 남원읍 한남리 지경이다. 이 오름 인근에 머체왓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머체’가 무슨 말일까? 이리저리 궁리해 봐도 마땅한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안내판 내용이다. “머체왓은 머체(돌)로 이루어진 밭(왓)이라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라 했다. 머체(마체)오름은 ‘머체’로 이루어진 오름, 또는 지형이 말의 형태(馬体)를 하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오름이라는 설도 있다.”
‘머체’의 뜻을 모르니 음상이 가장 가까운 말을 찾게 된다. 제주어에 머치 혹은 머체라는 말이 있다. 돌이 많거나 돌무더기가 널려 있는 경작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땅을 지시한다. 오름이 경작하는 곳인가? 다른 오름들은 경작하기 알맞다는 뜻인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말(馬) 형태여서 붙은 지명이라는 데까지 온 것이다. 이 오름이 지명에 반영될 만큼 유별나게 말을 닮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머체오름은 ᄆᆞ르쉬
마체악(馬体岳, 馬體岳)이라는 표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래 ‘머체’인 것을 ‘머’를 표기할 마땅한 한자가 없어서 ‘마(馬)’를 동원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체악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사실 이 오름이 돌무더기로 이루어졌다거나 말의 형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오름에 혹은 이 오름 주변에 경작이나 아니면 목축을 위해 필요하여 돌무더기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으나 오름이 돌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라는 것이 고대부터 있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말 모양이라는 설명도 개인의 생각일 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머체오름 혹은 마체오름이란 ‘머+체+오름’ 혹은 ‘마+체+오름’의 구조다. ‘머’ 혹은 ‘마’는 ‘ᄆᆞ르’의 변음이다. ‘체’는 ‘쉬’의 변음이다. ‘시’ 혹은 ‘수’로도 발음할 수 있다. ‘쉬’는 달랑쉬 지명에도 보인다. 체오름의 ‘체’도 같은 기원이다. 이것은 달랑쉬(다랑쉬) 지명에 나오는 시(時), 수(秀), 수(岫), 수(峀), 걸세오름 지명의 세, 쉐, 시, 서 등 다양한 음 중의 하나다. 모두 ‘수리’ 즉, 봉우리의 뜻이다. 마체 혹은 머체오름이란 망체오름과도 같은 지명 기원이다. 본 기획 관련 위의 여러 오름 편을 참조하실 수 있다. 머체오름이란 ‘ᄆᆞ르쉬’ 즉, 위가 평평한 봉우리라는 뜻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남원읍 수망리에 민오름이 있다. 표고 446.8m, 자체높이 97m다. 정상을 중심으로 남동 방향과 북서 방향으로 길게 뻗어 내린 등성마루가 두드러진다. 1703년 탐라순력도에 문악(文岳)으로 표기한 이래 민악(敏岳), 민악산(敏岳山), 민악오름, 민악(敏岳)으로 표기하였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 민오름으로 나온다.
나무가 없는 오름이라 하려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 상태가 지속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무가 있다가 산불 같은 재해로 나무가 사라진 것이라면 언젠가 또 나무가 울창해질 수 있다. 제주시 오라동의 민오름 지명은 ‘민악(珉岳)’, ‘문악(文岳)’, ‘미악(米岳)’, ‘쌀오름’, ‘민악(敏岳)’, ‘소독악(小禿岳)’, 족은민오름’, ‘술악(戌岳)’, ‘ᄀᆞㅣ오름’이 검색된다. 이 오름은 원래 믠오름으로 부르던 것이 민오름 또는 믜오름, 미오름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한자로 차용한 지명이 ‘민악(珉岳)’, ‘민악(敏岳)’, ‘문악(文岳)’ 등이고, 민둥산이었다는 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머체오름, 머체가 뭐?
그러나 이 오름은 인접한 남조순오름 등 다른 오름에 비해 나무가 없다거나 자라지 않는다는 특징도 증거도 없다. 다만, 등성마루가 평평하다는 특징이 있다. ‘ᄆᆞ르(마루)’ 오름이다. ‘ᄆᆞ르’는 ‘미’로도 축약된다.
그러니 미오름이라는 지명이 생겼다. 여기에 관형격 ‘ㄴ’이 붙으면 민오름이 된다. 쌀오름은 미악을 한자로 차자 표기한 것을 다시 쌀오름으로 번역한 오독이다. ‘술악(戌岳)’ 역시 쌀을 중세에는 ‘ᄉᆞᆯ’이라 했으므로 이의 다른 표기다. ‘ᄀᆞㅣ오름’은 ‘ᄉᆞᆯ오름’과 음상이 비슷한 한자를 동원하여 ‘술악(戌岳)’으로 썼고, 다시 이 술(戌)이 ‘개 술’이니 여기서 분화한 표기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본 기획에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민오름을 ‘골짜기가 없는 오름’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독한 바 있으나, 이것은 인근의 병악이 골짜기 있는 오름이라는 뜻이고 이에 대비 지명으로 골짜기가 없어 민오름이라 한다는 취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민오름은 ‘ᄆᆞ르’오름이라는 뜻이다. 즉, 산등성이가 길게 형성된 오름이라는 뜻이다. 문도지오름도 같다. 남원읍 수망리의 민오름 역시 ‘ᄆᆞ르’ 오름이란 뜻이다.
이 민오름 서쪽으로 머체오름이 있다. 남원읍 한남리 지경이다. 이 오름 인근에 머체왓이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머체’가 무슨 말일까? 이리저리 궁리해 봐도 마땅한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안내판 내용이다. “머체왓은 머체(돌)로 이루어진 밭(왓)이라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라 했다. 머체(마체)오름은 ‘머체’로 이루어진 오름, 또는 지형이 말의 형태(馬体)를 하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오름이라는 설도 있다.”
‘머체’의 뜻을 모르니 음상이 가장 가까운 말을 찾게 된다. 제주어에 머치 혹은 머체라는 말이 있다. 돌이 많거나 돌무더기가 널려 있는 경작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땅을 지시한다. 오름이 경작하는 곳인가? 다른 오름들은 경작하기 알맞다는 뜻인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말(馬) 형태여서 붙은 지명이라는 데까지 온 것이다. 이 오름이 지명에 반영될 만큼 유별나게 말을 닮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머체오름은 ᄆᆞ르쉬
마체악(馬体岳, 馬體岳)이라는 표기도 간혹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래 ‘머체’인 것을 ‘머’를 표기할 마땅한 한자가 없어서 ‘마(馬)’를 동원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체악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 사실 이 오름이 돌무더기로 이루어졌다거나 말의 형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오름에 혹은 이 오름 주변에 경작이나 아니면 목축을 위해 필요하여 돌무더기가 만들어졌을 수는 있으나 오름이 돌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라는 것이 고대부터 있었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말 모양이라는 설명도 개인의 생각일 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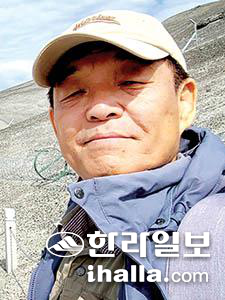 |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