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백록담] 임금 체불
입력 : 2025. 09. 22(월) 01:30수정 : 2025. 09. 22(월) 10:15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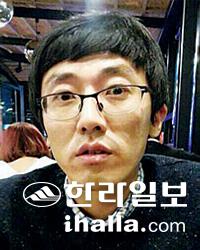
[한라일보] 대학생 실습기자 시절 관광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적이 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취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루는 모 특급호텔에 몰래 들어가 룸메이드 노동자와 인터뷰를 하려다 지배인에게 들키고 말았다.
어쩔 줄 몰라 말을 더듬자 어머니뻘 되는 룸메이드 노동자는 황급히 내 말을 가로챘다. 그는 "학생이 길을 잃었다"고 둘러대고선 귓속말로 "나중에 전화하라"며 내 손바닥에 전화번호를 적어줬다.
모 동물공연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여기는 보는 눈이 많다"며 공연장 뒤편으로 나를 끌고 갔다. 식물원 가장자리 한 구석에서 숨죽여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노동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건 내가 어리숙한 대학생 실습기자인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신분을 들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되기 때문일 테다. 임금을 제때 못 받아 생계가 위태로워도 망설여지기는 마찬가지다. 임금 체불 신고는 끝끝내 참다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로관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들은 더욱 신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도입했다. 이름을 가리고 피해를 제보할 수 있어 신원 노출 위험이 덜하다. 도입 첫해 정부는 제보받은 37곳 중 무려 31곳에서 실제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청산·사법 처리했다. 임금체불 구조와 각자 처한 사정이 복잡 다난하고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 제주시는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60~70명이 임금을 못 받은 걸 파악하고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0년 도입된 제도에 따라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조사 권한이 있는 노동청이 개입해 사업주를 추적하고, 임금 체불 과정에서 자금 횡령 등 범죄가 관여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을 겪어도 신고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리하는 측면도 있다.
시는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도청 노동부서와 노동청 산하 근로개선지원센터는 '지자체 신고 의무를 아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에 한결같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온 세상 모든 근로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도내 각 기관마다 임금체불 예방·점검 대책을 쏟아내지만 영 미덥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저 연례행사처럼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정작 점검할 대상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민 정치경제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모 동물공연장에서 만난 노동자는 "여기는 보는 눈이 많다"며 공연장 뒤편으로 나를 끌고 갔다. 식물원 가장자리 한 구석에서 숨죽여 인터뷰에 응한 노동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하곤 대다수 노동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건 내가 어리숙한 대학생 실습기자인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가 신분을 들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되기 때문일 테다. 임금을 제때 못 받아 생계가 위태로워도 망설여지기는 마찬가지다. 임금 체불 신고는 끝끝내 참다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근로관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들은 더욱 신고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도입했다. 이름을 가리고 피해를 제보할 수 있어 신원 노출 위험이 덜하다. 도입 첫해 정부는 제보받은 37곳 중 무려 31곳에서 실제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청산·사법 처리했다. 임금체불 구조와 각자 처한 사정이 복잡 다난하고 피해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 제주시는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60~70명이 임금을 못 받은 걸 파악하고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0년 도입된 제도에 따라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수사·조사 권한이 있는 노동청이 개입해 사업주를 추적하고, 임금 체불 과정에서 자금 횡령 등 범죄가 관여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을 겪어도 신고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대리하는 측면도 있다.
시는 법을 몰라서 신고를 못했다고 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도청 노동부서와 노동청 산하 근로개선지원센터는 '지자체 신고 의무를 아느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질문에 한결같이 "모른다"고 답변했다.
온 세상 모든 근로자가 풍성해야 할 추석을 앞두고 도내 각 기관마다 임금체불 예방·점검 대책을 쏟아내지만 영 미덥지 않는 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저 연례행사처럼 시늉만 내는 것은 아닌지, 정작 점검할 대상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민 정치경제부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