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제주도 땅의 변천사
입력 : 2011. 01. 06(목) 00:00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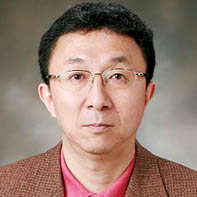
2011년 새해 벽두에 제주도 땅의 변천 과정을 회고해 본다. 뜬금없는지는 몰라도 올해로 1961년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해 제주도내 마을공동재산의 시·군 귀속이 이루어진 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같은 해 5·16 군사정변으로 태동한 박정희 정부가 토지를 매개로 한 제주지역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제주도 개발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반추가 아닐까 한다.
제주도민들은 오래 전부터 경작이 가능한 해안지대의 토지를 공동체가 골고루 나눠 갖는 형평의 삶을 영위해 왔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작성된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보면, 필지가 부여된 토지들이 촘촘하게 분할된 모습을 통해서 쉽게 이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땅은 개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다. 해안지대 토지의 대규모 매각으로는 1930년대 일본 군부가 헐값으로 강제 매입한 모슬포 알뜨르 민유지가 첫 사례가 아닐까 한다. 1960년대 이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민유지가 매매의 대상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제주도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간지대 이상의 목장 및 한라산록 땅의 변천 과정에 있다. 광활한 이 땅은 조선시대 이래 국영목장으로 관리되어 국유지로 인식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상당 부분이 화전 및 목장토로 경작되면서 개간지로 여겨졌지만 세금 수탈로 인해 민란의 진원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말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은 각 마을의 공유지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역둔토 관리 대상에 오른 이 땅 가운데 민간에 불하된 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공동목장으로 전환되었다. 4·3사건을 거치며 공동목장이 개인에게 매각되거나 군의 소유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동목장은 대부분 온존되었다.
그러나 1961년 시행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마을 소유지였던 목장용지가 시·군에 귀속되면서 주민들은 시·군유지를 임대받아 목축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법이었지만 제주지역의 역사적인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막대한 것이었다.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와 공동목장(마을주민) 간의 법적인 분쟁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장소유권은 자치단체에 넘어갔지만 목장관리권을 갖고 있는 공동목장조합이 행정당국의 권유 및 회유에 의해 관광개발과 마을 발전의 명분 아래 쉽게 개발업체에 매각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목장용지가 전부 매각되면서 목장을 관리하는 목장조합이 해체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백 년 이어온 마을 주민의 공동 재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개발의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다.
최근 보전의 필요성이 지적돼온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한 공유지가 개발 대상인데, 이 땅은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수준의 보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이다. 무엇이 급해서 서둘러 인허가 처리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시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지방정부는 이 땅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쓰게끔 중재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씹게 하는 대목이다. 땅의 법적 소유는 자치단체가 가졌는지 몰라도 역사로나 현재의 인식으로나 진정한 소유자는 주민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박 찬 식 역사학자>
문제는 제주도 면적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간지대 이상의 목장 및 한라산록 땅의 변천 과정에 있다. 광활한 이 땅은 조선시대 이래 국영목장으로 관리되어 국유지로 인식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상당 부분이 화전 및 목장토로 경작되면서 개간지로 여겨졌지만 세금 수탈로 인해 민란의 진원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말 공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땅은 각 마을의 공유지로 전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역둔토 관리 대상에 오른 이 땅 가운데 민간에 불하된 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마을공동목장으로 전환되었다. 4·3사건을 거치며 공동목장이 개인에게 매각되거나 군의 소유지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동목장은 대부분 온존되었다.
그러나 1961년 시행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마을 소유지였던 목장용지가 시·군에 귀속되면서 주민들은 시·군유지를 임대받아 목축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법이었지만 제주지역의 역사적인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 이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박탈감은 막대한 것이었다.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와 공동목장(마을주민) 간의 법적인 분쟁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목장소유권은 자치단체에 넘어갔지만 목장관리권을 갖고 있는 공동목장조합이 행정당국의 권유 및 회유에 의해 관광개발과 마을 발전의 명분 아래 쉽게 개발업체에 매각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목장용지가 전부 매각되면서 목장을 관리하는 목장조합이 해체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수백 년 이어온 마을 주민의 공동 재산이 우리가 살아가는 '개발의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넘겨버리는 것은 아닌가 한다.
최근 보전의 필요성이 지적돼온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산록도로 북쪽에 위치한 공유지가 개발 대상인데, 이 땅은 생물권보전지역 중 완충지역수준의 보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토지이다. 무엇이 급해서 서둘러 인허가 처리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다시금 땅은 우리에게 무엇이고, 지방정부는 이 땅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쓰게끔 중재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씹게 하는 대목이다. 땅의 법적 소유는 자치단체가 가졌는지 몰라도 역사로나 현재의 인식으로나 진정한 소유자는 주민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박 찬 식 역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