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전곡리와 제주문화
입력 : 2010. 12. 02(목) 00:00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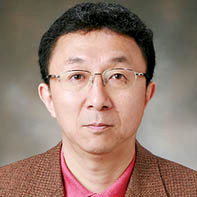
달포 전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에 다녀왔다. 전곡리는 한반도 중심의 한탄강이 가로지르는 휴전선 철책을 가까이 둔 곳이다. 지난 1978년 이 곳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시대의 주요 유물인 주먹도끼 등 찍개와 긁개 등이 발견됐다. 1979년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500여 점의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발견됐다. 발굴 유물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 때문에 전 세계 선사문화 전문 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도 197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 및 기획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전곡리 선사유적지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5년부터 이 곳에 세계적인 구석기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국비 161억원, 도비 311억원 등 총 4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건립사업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어 내년 5월이면 개관할 예정이다. 박물관 공사 현장 곳곳을 안내한 현장 책임자는 예전 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고고학 전문가였다. 그로부터 참으로 신선한 자극을 받았기에 몇 가지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박물관 건축에 관련해서 국제설계 공모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48개국 346팀이 응모한 작품 가운데 프랑스 X-TU의 건축전문가 아눅 르졍드르의 작품이 당선돼 현재의 아름다운 건물 외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당선작은 건축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내부 전시 내용 및 시설에 관련된 구상도 함께 담겨진 것이었다.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 및 전시관이 내부의 전시는 외면한 채 건물의 형체만 완성해 버리는 상식을 넘어선 것이었다. 제주의 4·3평화기념관 건축 때 건물과 전시가 따로 놀았던 시행착오가 떠올랐다.
다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국비·도비 예산을 확보한 것도 중요했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주관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1995년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가 3년 간 9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출범한 경기문화재단은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를 거느린 막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관리 운영은 경기문화재단의 몫이었다.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진흥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경기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었기에 고고학과 미술 전문가가 전곡리 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뜻밖에도 박물관의 전시업체로는 제주의 (주)비엠비가 입찰경쟁을 통과하여 당당하게 전시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었다. 이 업체는 4·3평화기념관 전시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현장의 전문가들도 치밀한 작업 과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곡리 박물관 공사 현장을 나오면서 제주도의 문화계 현실은 어떤지 되새김질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행정공무원으로 수북히 쌓인 공립박물관과 전시관, 각종 사적지. 400억 원이 투입된 4·3평화기념관은 공무원의 겸직에 내맡겨진 채 제대로 된 기획전시 한 번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재단을 통 크게 키우려는 내부역량은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인지. 떡반 나누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에만 머물러버린 재단의 소극적 행태를 제주의 문화인들이 모두 성찰해 볼 일이다.
앞으로 항파두리 유적 발굴, 제주성터 발굴 및 복원, 고산리 선사유적의 본격 정비 사업 등 제주의 문화자원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자원을 보석으로 가꾸고 활용해 나갈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굴한 자원과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주의 문화 미래는 어둡다고 감히 진단해 본다. <박찬식 역사학자>
우선 박물관 건축에 관련해서 국제설계 공모를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48개국 346팀이 응모한 작품 가운데 프랑스 X-TU의 건축전문가 아눅 르졍드르의 작품이 당선돼 현재의 아름다운 건물 외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더욱이 당선작은 건축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내부 전시 내용 및 시설에 관련된 구상도 함께 담겨진 것이었다. 한국의 국·공립 박물관 및 전시관이 내부의 전시는 외면한 채 건물의 형체만 완성해 버리는 상식을 넘어선 것이었다. 제주의 4·3평화기념관 건축 때 건물과 전시가 따로 놀았던 시행착오가 떠올랐다.
다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국비·도비 예산을 확보한 것도 중요했지만,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주관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1995년 민선 1기 이인제 도지사가 3년 간 9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출범한 경기문화재단은 전통문화와 공연예술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를 거느린 막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관리 운영은 경기문화재단의 몫이었다.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진흥본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고 본다.
경기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었기에 고고학과 미술 전문가가 전곡리 박물관의 건축 및 전시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뜻밖에도 박물관의 전시업체로는 제주의 (주)비엠비가 입찰경쟁을 통과하여 당당하게 전시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으로 뿌듯한 일이었다. 이 업체는 4·3평화기념관 전시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충분히 이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현장의 전문가들도 치밀한 작업 과정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곡리 박물관 공사 현장을 나오면서 제주도의 문화계 현실은 어떤지 되새김질 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행정공무원으로 수북히 쌓인 공립박물관과 전시관, 각종 사적지. 400억 원이 투입된 4·3평화기념관은 공무원의 겸직에 내맡겨진 채 제대로 된 기획전시 한 번 치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재단을 통 크게 키우려는 내부역량은 우리에게 갖추어진 것인지. 떡반 나누는 문예진흥기금 운영에만 머물러버린 재단의 소극적 행태를 제주의 문화인들이 모두 성찰해 볼 일이다.
앞으로 항파두리 유적 발굴, 제주성터 발굴 및 복원, 고산리 선사유적의 본격 정비 사업 등 제주의 문화자원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자원을 보석으로 가꾸고 활용해 나갈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굴한 자원과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제주의 문화 미래는 어둡다고 감히 진단해 본다. <박찬식 역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