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논단]경계를 넘어선 제주도 문화
입력 : 2010. 10. 07(목) 00:00
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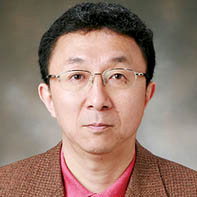
지난 9월 18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주제: '타자가 본 제주도')에 토론자로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평하게 된 발표 주제는 타이완에서 온 주헤이추(朱惠足) 교수의 '탈경계 역사, 탈경계 사상:대만과 제주도의 대화'였다.
주 교수는 1920년대로부터 타이완에서 오키나와로 이주해 간 타이완사람들의 문화사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중국과 일본 본토(국경)를 벗어나서 섬에서 섬으로 이주한 탈경계 지대의 사람들로서 국가사에서 외면한 아웃사이더를 중심에 놓고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들 이주 타이완사람들과 오사카로 이주한 제주사람들의 경험을 상호 비교하는 데까지 연구의 관심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다.
주 교수의 글은 타이완사람의 오키나와 이주 역사와 제주사람의 오사카 이주 경험을 탈경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국가사에 갇혀 있던 지역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 최근 한국학계에서도 탈근대성 문화의 영향에 따라 지구지역성(Glocality)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교수의 글은 매우 좋은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주 교수의 발표를 듣고 평소 '제주도-오키나와-타이완'과의 섬 문화 아이덴티티 상호 연관성에 관심이 있던 차에 많은 학문적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들 세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소 외에도 많은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정치체제의 운영 경험, 대륙 세력과의 교류 및 병합의 과정, 국가·민족의 '육지식' 사상과 물리력에 지배당하고 테러를 당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점이 꽤 많았다.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로부터 전후 국가체제 형성기에 비슷한 대규모 원주민 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시기에 타이완사람들이 전쟁에 강제 동원되거나 전쟁을 피해 오키나와로 간 사례는 없는지 궁금했다. 또한 대륙 국민당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은 2·28 사건 당시 오키나와로 밀항한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했다.
주 교수는 타이완의 2·28사건과 제주의 4·3사건을 비교·검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 집단학살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섬 주민들은 상호 유사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과 국가를 벗어난 진정한 보편시민으로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한다. 젊고 역량 넘치는 주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1998년의 섬문화축제가 떠올랐다. 100억원을 넘긴 엄청난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라도 할애해서 '섬문화학술대회'를 그때 열었으면 어땠을까 회고해본다.
제주도는 바다를 통해 열린 섬이지만 수동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바다에 의해 갇힌 섬이기도 하다. 출륙금지령으로 묶여있던 폐쇄와 질곡의 섬을 뚫고 나간 출가해녀와 일본 도항노동자, 출향민의 삶을 우리는 소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해 기회의 섬 제주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제주가 국제교류의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이주민들을 우리 역사문화의 주인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수출 지향의 도정 목표를 세웠는데, 경제 지표에만 머물지 말고 이러한 인문적 시각도 장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박찬식 역사학자>
주 교수의 글은 타이완사람의 오키나와 이주 역사와 제주사람의 오사카 이주 경험을 탈경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국가사에 갇혀 있던 지역사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 최근 한국학계에서도 탈근대성 문화의 영향에 따라 지구지역성(Glocality)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 교수의 글은 매우 좋은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주 교수의 발표를 듣고 평소 '제주도-오키나와-타이완'과의 섬 문화 아이덴티티 상호 연관성에 관심이 있던 차에 많은 학문적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들 세 지역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소 외에도 많은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정치체제의 운영 경험, 대륙 세력과의 교류 및 병합의 과정, 국가·민족의 '육지식' 사상과 물리력에 지배당하고 테러를 당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발표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궁금한 점이 꽤 많았다.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로부터 전후 국가체제 형성기에 비슷한 대규모 원주민 피해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 시기에 타이완사람들이 전쟁에 강제 동원되거나 전쟁을 피해 오키나와로 간 사례는 없는지 궁금했다. 또한 대륙 국민당 정권으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은 2·28 사건 당시 오키나와로 밀항한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했다.
주 교수는 타이완의 2·28사건과 제주의 4·3사건을 비교·검토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 집단학살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섬 주민들은 상호 유사한 역사문화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과 국가를 벗어난 진정한 보편시민으로서 서로를 볼 수 있는 여유가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한다. 젊고 역량 넘치는 주 교수의 발표를 들으면서 1998년의 섬문화축제가 떠올랐다. 100억원을 넘긴 엄청난 예산 가운데 극히 일부라도 할애해서 '섬문화학술대회'를 그때 열었으면 어땠을까 회고해본다.
제주도는 바다를 통해 열린 섬이지만 수동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바다에 의해 갇힌 섬이기도 하다. 출륙금지령으로 묶여있던 폐쇄와 질곡의 섬을 뚫고 나간 출가해녀와 일본 도항노동자, 출향민의 삶을 우리는 소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바다를 통해 기회의 섬 제주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제주가 국제교류의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이주민들을 우리 역사문화의 주인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수출 지향의 도정 목표를 세웠는데, 경제 지표에만 머물지 말고 이러한 인문적 시각도 장착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박찬식 역사학자>



